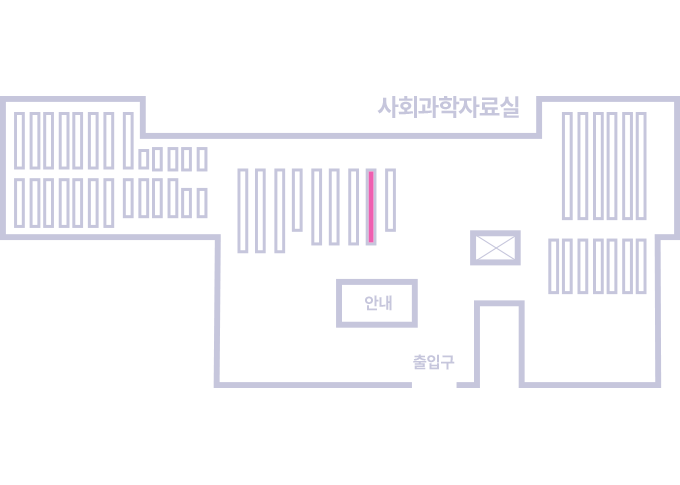밭에 가는 날은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날이다. 애인이랑 데이트하러 가는 날처럼 좋다. 이 글은 밭농사 이야기이면서, 바다보다는 시냇물 같은 인생 소풍 이야기이다.
어떻게 주렁주렁 감자의 살덩이들이 만들어지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보물창고 같은 땅속,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내가 한 것이라고는 씨감자를 흙에 심기만 했을 뿐. 오일장 날 그냥 주름살이 맘씨 좋아 보이는 어르신한테서 깎지 않고 샀을 뿐. 햇빛을 마시고 비를 맞고 혼자서 알아서 다 했다. 감자를 심고 캐본 사람은 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자연과는 먼 도시 생활을 언제나 꿈꿨다. 그때는 몰랐다. 지금 이렇게 늙은 딸이 더 늙은 부모와 텃밭 농사를 하게 될 줄은. 꽤 괜찮다. 일 시키는 직장 상사도 없고 지긋지긋한 야근도 없다. 마음이 편하다. 땅은 내가 땀 흘린 만큼의 먹거리를 내어준다. 솔직하고 정직하다. 수확을 기다리는 기쁨은 마치 지난 시절, 수렵 채집하던 구석기의 본능을 추억하게 한다. 무엇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이다. 이 일상을 내 모든 행복으로 삼고 싶다.
농사라는 게 식물을 다루는 일인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고라니도 쥐도 생각할 일이다. 생명을 기르면서도 생명을 내치기도 하는 아이러니가 있다.
본격적인 아빠의 로터리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지 감자를 심을 자리이다. 엄마와 내가 배추 뽑은 고랑 검정 비닐을 걷어내는 일을 끝내고도 흙들이 뒤집히는 소리가 한창이었다. 아빠는 지금 지구를 갈아엎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알았다. 군산으로 내려올 결심을 하고 나서 아빠는 오빠에게 따로 한 말이 있다는 것을.
“너는 가족이 있고 잘 벌어 먹고 살지만, 네 동생은 혼자서 저렇게 자주 아프고 하니 나랑 네 엄마가 내려가서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건 해줄라 헌다. 내 비록 늙었어도 부모로서 저 혼자 먹고 살아갈 가장 편한 길이 뭔지를 가서 해놔야 하지 않겄냐.”
아빠는 계획이 다 있었다. 텃밭이 다가 아니었다. ‘텃밭을 가장한 과년한 딸 노후대책 만들어놓기’인 것이었다.
점심을 준비해서 밭에 도착하니 아빠는 다 베어서 말려놓은 깨나무 더미를 나르고 있었고, 넓지막한 포장 위에서 엄마는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웃는 엄마 아빠는 한 폭의 그림이었다. 내 눈에는 밀레의 ‘이삭줍기’나 ‘만종’과는 급이 다른 또 하나의 명작이라고나 할까.
그 순간 그냥 이유 없이 감사했다.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순하게 살아온 생, 저 여자와 남자가 내 엄마 아빠라는 것이 감사했다. 가을 황금 햇살이라서 감사했고, 우리 셋이 오늘 슬플 일 없이 깨를 털 수 있는 것에도 감사했다.
이제 우리는 공항 대신 푸른 하늘 아래 우리 텃밭으로 간다. 말하지 않아도 그게 여행인 것을 우리는 서로 안다. 텃밭이 그 비행기 날던 하늘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가 죄다 여행인 것이다. 파란 이파리, 파란 벌레, 여러 때깔의 열매는 여행 볼거리로 부족함이 없다. 원두막에서 먹는 밥이 현지식인 것이다. 마침 우리 밭 저만치에 기차가 지나간다.
엄마와 딸은 서로가 친정이다. 모든 엄마는 그 딸의 딸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무슨 말인지 딸들은 다 안다. 엄마를 호강시켜드리는 신박한 방법에 이만한 게 없다는 것을. 고생만 한 우리 엄마, 딱 한 번의 목숨이 더 주어진다면 다음 생에는 내 딸로 태어나기를.
“엄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 같아? 엄마는 인생을 뭐라고 생각해?”
“인생이 뭐가 있니? 목숨 붙었으니 사는 거지.”
엄마의 대답은 동그라미처럼 쉽고 간결하다. 늘 같은 대답이다. 인생은 뭐가 없다는 거. 이상하게 입에 촥 달라붙는다.
손바닥만큼의 땅이라도 남으면 씨앗 하나라도 더 심어서 우리 식구 다 못 먹으면 남 주면 된다는 착한 농부. 그렇다고 더 많은 수확을 위해 힘들여 억척스럽게 하는 그런 노동이 아니라, 나이 들어 운동 삼아 욕심 없이 재미나게 한다는 말씀도 나는 아름다운 철학처럼 들렸다.
층층시하 농사꾼 집에 시집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여자는 아침드라마처럼 다정하게 『늑대를 잡으러 간 빨간 모자』를 읽어주며 아이를 재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손에 쥔 것은 엄마처럼 꼬부라진 호미가 아니라 여성잡지나 백 선생 요리책일지도….
몇 날 며칠을 끼우고 맞추고 다시 세워가며 완성한 엄마의 꽃 같은 표정을 봤다면… 손주한테도 주기 싫은 게 맞다고 본다. 가족을 위한 것 말고는 엄마가 온전히 자신의 것을 가져본 적이 있던가. 비록 종이 쪼가리일지라도 죽을힘을 다해 자신의 것을 지키는 엄마였으면 한다.
친구 맺기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실연의 감정을 감당해야 할 우정과 사랑보다는 느슨한 연결고리의 관계를 선호하게 되었다. 정체성이나 취향을 기반으로 하는 그 힘을 믿는다. 어쩌면 가족보다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예비 무연고자 즉 우리 비혼 독거인끼리 어떻게 하면 서로를 준가족의 테두리에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주 아주 나중에는 주거방식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본다.
나는 늘 아프다. 내 몸이 감옥 같다. 나는 내 몸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가석방도 없는 종신형의 형벌이다. 처음부터 타고난 약골은 아니었다. 학원 강사였는데, 천성이 말소리가 크고 목 관리에 소홀하니 목감기를 달고 다녔다. 그 후로도 꾸준히 성실하게 아픈 덕에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저 체질에 저 체력의 아이콘이 돼 있었다.
인생은 언제나 꽃이 아닌 때가 없다. 또 다른 꽃을 피우자.
나와 제일 잘 맞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서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혼자 외식, 혼자 극장, 혼자 산책, 혼자 노래방, 혼자 등산. 나와 마주하는 내면의 고요를 좋아한다. 생의 끝자락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나의 예비 장례식을 치르고 혼자 고독사 하고 싶다. 바람 불면 날이 저무는 것과 같이.
‘고독’과 ‘유대’라는 양 날개의 균형 있는 날갯짓을 위해서 나는 독거 비혼을 선택했다. 독거 비혼이야말로 완전한 자유가 전제되기 때문에, 양쪽 세계의 장점을 다 누릴 수가 있다.